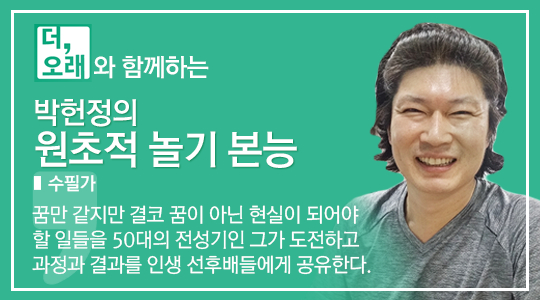예전에는 뒤로 넘는 배면뛰기 대신 배를 땅 쪽으로 한 채 뛰어넘는 롤 오버 방식을 배웠다. 뒷발이 막대에 걸리지 않도록 살짝 들어올리며 넘어야 하는데, ‘발을 차라’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발로 허공을 차고 내지르다가 계속 실패했다. 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V
지난주에 육상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가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며 큰 무대에서 개인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걸 보니 젊음의 힘이 느껴졌다.
중계를 보며 중학교 체육 시간의 추억이 떠올랐다. 높이뛰기 수업이었다. 육상선수처럼 뒤로 넘는 것(배면뛰기)도 아니고, 태권도장 아이처럼 앞으로 폴짝 뛰는 것도 아니고, 배를 땅 쪽으로 향한 채 옆으로 넘는 롤 오버 방식이었다. 높이는 기껏해야 1m 정도였다. 첫 시도에 절반 정도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다. 2차, 3차, 4차…. 계속되는 사이에 탈락자 대열의 숫자는 점점 줄어 끝내 네 명만 남았는데, 평소에 운동을 곧 잘하던 나하고 운동과는 거리가 먼 친구 셋이었다. 선생님은 가로막대(bar) 높이를 낮추며 따로 지도해 주셨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후에 생각해 보니 선생님의 설명을 잘못 받아들였다. 막대와 나란히 엎드린 자세로 한 발이 막대를 넘는 순간 따라오는 발이 막대를 치지 않도록 들어주라는 것인데, “뒷발을 차라”고 하니, 넘기도 바쁜 허공에서 발차기까지 하려다가 걸리곤 했다. 공중에서 엎드린 자세로 왼발을 내지르는 모습이 감전된 개구리가 움찔하는 것 같았던지 구경하던 아이들이 웃으며 난리 쳤다. 대중 앞에서 실패를 반복한 쓰린 기억은 꽤 오래갔다. 차라리 아무 설명도 없었다면 알아서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들어주었을 것이다. 설명을 대충 들은 아이들은 본능대로 해서 성공했고, 나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손해 본 것 같았다.
수영을 배울 때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 강사가 접영 팔 동작을 설명하는데, 양팔을 휘두르며 내려오다가 가슴 부근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둥근 원을 그렸다. 그의 설명대로 다들 물속에서 두 손으로 축구공 모양을 만들어가며 기이한 접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배 쪽으로 물을 밀어주며 물 밖으로 나오라는 의미였다.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물 밖에서 평면적으로 설명하니 이해될 리 없었다. 물에서 나올 때는 두 발로 차며 나오라(출수, kick)는데, 초보자는 그럴 틈도 없고, 차려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벌써 몸이 뻣뻣해져 발이 땅에 닿았다. 제대로 웨이브를 해서 두 발로 물을 누르며 나오다 보면 발이 물을 차는 것처럼 보이니 ‘차라’고 표현한 것이다. 질문해도 시원한 답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해 보자’라며 혼자 연습했다. 몇 달 후 강사는 내가 거의 독학으로 완성한 접영을 보곤 자기가 시킨 대로 잘한다며 사람들 앞에서 칭찬했다. 그의 설명이 틀렸던 걸까? 그렇지 않다. 목적은 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주파수가 맞지 않은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 표현이 그에게는 표준이고 최선이다.
![능숙한 사람이 서툰 사람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척 많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끔 그의 언어로 말해주지 않는다면 지식 자랑에 그치고 말 것이다.[사진 박헌정]](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8/15/cee1245f-58b5-403e-9340-4cc7190b4967.jpg)
능숙한 사람이 서툰 사람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척 많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끔 그의 언어로 말해주지 않는다면 지식 자랑에 그치고 말 것이다.[사진 박헌정]
그래서 나의 아내는 설명을 맹신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선택적 믿음’ 이론을 편다. 상대와 나의 몸이 다르고 표현방식도 다르니, 설명이 항상 정답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와 동시에 수영을 배웠어도 나보다 훨씬 잘한다. 물론 설명을 무시하는 아내도, 집착하는 나도 문제가 있다. 적당해야 한다.
학습을 위한 말에는 효과가 있어야 하고, 학습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표현이 정확해야 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건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예전에 고등학교에 교생실습 나갔을 때, 나의 교육자 자질에 의문을 느껴봤다. 그전까지는 남 앞에서 말을 잘하고 설명하는 재주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핵심을 요약해 설명하는 것은 잘했지만 그걸 학생 머리에 집어넣는 능력이 없었다. 나는 내 말을 했을 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 귀에 내 의도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 하는데 왠지 손가락의 반지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말이 끊이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나오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말 잔치가 끝나면 내용은 허공에 흩어지고 결국 자기만의 퍼포먼스로 끝나고 마는 때도 잦다. 학생들이 흠뻑 빠져들어 한참 웃고 재미있어 해도 수업 끝나면 뭘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건 상대방의 관점과 눈높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이다. 아파트 마당에서 둘째가 인라인을 연습하는데, 겨우 중심만 잡고 제대로 나가지는 못하자 초등 3학년짜리 큰아이가 한마디 했다.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뒤로 힘줘서 밀어.” 지금까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훌륭한 레슨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둘째는 힘차게 인라인을 지치며 앞으로 나갔다.
무조건 많은 정보를 들이밀며 가르치려 드는 건 이쪽의 욕심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기에, 많이 들을수록 헷갈리기만 한다. 스스로 익힐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 잘 지켜보면서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수준에서 알아듣게끔 한마디 해주는 게 진정한 고수 아닐까. 필요한 말만 짧고 정확하게! 그래야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상대방 언어로 짧고 정확하게…말잔치가 안 되려면